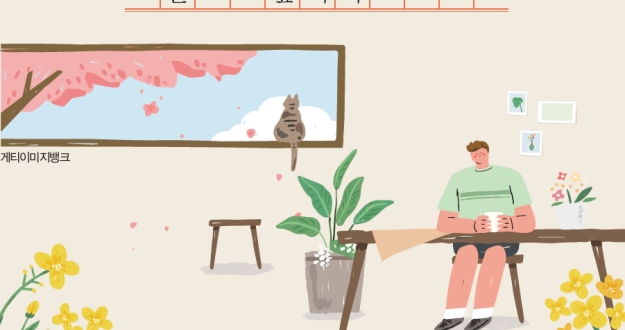나이 탓인가. 봄날이 까닭 없이 슬프다. 울컥울컥 마음속으로부터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가 끝내는 눈가에 엷은 눈물을 만들고 가슴속에 알싸한 슬픔을 남긴다. 오래오래 가슴을 휘젓고 다닌다.
까닭이 있겠지. 나이 핑계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 눈부시도록 찬란한 봄을 어찌 슬프게 느끼겠는가. 그 또한 무용(無用)한 센티멘털이 아니라 고귀한 생명의 한 발현이라 하겠지.
목숨 없는 존재는 아예 슬프거나 애달프거나 그런 감상조차도 못 느끼는 것 아닌가. 아, 내가 아직도 살아 있는 목숨이기에 봄을 다시 맞이하고 이리 슬프기도 하고 기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것이구나.
새잎이 날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새잎이 났고 꽃이 필 때 우리 또한 피어나는 꽃나무가 되고 싶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끝내 새잎도 피우지 못하고 꽃잎도 제대로 피우지 못한 채 봄이 또다시 이렇게 저물고 있는 것이다.
봄날이 왔다! 그 감탄보다는 아, 봄날이 이렇게 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무너지는 목숨이 된다. 하기는 이러한 감상은 젊은 시절에도 일찍이 그랬던 것 같다. 제멋대로 푸르고 당당하던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맞았을 때쯤일 것이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스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닫이가/ 우련 붉어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이 시는 조지훈 시인이 일제강점기 강원도 월정사에 칩거하면서 그 막막한 심정을 읊은 ‘낙화’란 작품이다. 나는 왠지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못내 좋았다.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그런데 나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 외우곤 했다. “꽃이 피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꽃이 지는 아침에 울고 싶은 마음보다 꽃이 피는 아침에 울고 싶은 마음은 그냥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감상이 아니라 하나의 힘찬 도약의 마음일 수도 있다.
며칠 전 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준비한 ‘꽃 시(詩) 전시회’에 다녀왔다. 코로나19로 우울한 일상을 위로하자는 뜻으로 마련한 행사인데 우리나라의 근현대 시 가운데 꽃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었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필두로 12편의 작품이었는데 나의 시 ‘풀꽃’이 맨 끝에 전시돼 있었다. 놀랍게도 12편의 시를 쓴 시인들 가운데 오로지 나 한 사람만이 생존 시인이었다. 내가 아무래도 너무 오래 세상에 살아 있는 사람인 게 아닌가 하는 감회가 없지 않았다.
 나태주 시인_ 풀꽃 시인. 전 한국시인협회장. 100여 권의 문학 서적을 발간했으며 충남 공주에서 풀꽃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태주 시인_ 풀꽃 시인. 전 한국시인협회장. 100여 권의 문학 서적을 발간했으며 충남 공주에서 풀꽃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나태주 시인_ 풀꽃 시인. 전 한국시인협회장. 100여 권의 문학 서적을 발간했으며 충남 공주에서 풀꽃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태주 시인_ 풀꽃 시인. 전 한국시인협회장. 100여 권의 문학 서적을 발간했으며 충남 공주에서 풀꽃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