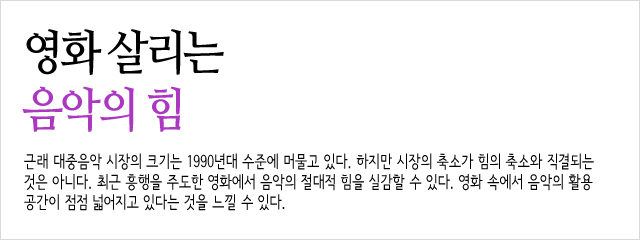
대중음악의 파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한다. 디지털 시장이 개화했을 때 기존 오프라인 시장의 매출액인 4천억원 수준에서 1조원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로 충만했지만 정작 근래 대중음악 시장의 크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쳐도 1990년대 수준인 4천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음악관계자 중에는 “이제 음악시장은 끝났다. 과거 좋았던 때를 재현하려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시장의 축소가 힘의 축소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음악 본연의 힘이 떨어진 것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흥행을 주도한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이 영화에 이 노래와 이 음악이 빠졌다면’ 하는 가정을 하는 순간, 음악의 절대적 힘을 실감할 수 있다.
4월 극장가를 강타한 영화 <건축학개론>을 본 관객들은 첫사랑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플롯도 인상적이지만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전람회의 곡 ‘기억의 습작’이 감동을 주도했다는 공통의 소감을 밝힌다. 전람회는 1990년대 FM 라디오 여성 청취자들을 붙들어 맸던 김동률·서동욱의 남성듀엣이며 ‘기억의 습작’은 그들의 1994년 첫 앨범 대박 히트곡이다.

30~40대 주부를 대거 영화관으로 몰고 나온 지난해 흥행작 <써니>는 가히 음악영화라고 할 만큼 음악의 쓰임새가 큰 효과를 냈다.
팝송 보니 엠의 ‘써니’를 비롯해 신디 로퍼의 ‘Time after time’(영화에선 ‘턱 앤 패티’의 노래로 나오지만) 그리고 나미의 ‘빙글빙글’, ‘보이네’,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이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만끽케 했다.
 영화 <도가니>에서는 조성모가 리메이크해 빅히트 친 ‘가시나무’가 아련히 깔려 흥행몰이에 보탬이 됐다는 평을 받는다. 올해 엄정화, 황정민 주연의 <댄싱 퀸>에서 엄정화는 가수 출신의 이력을 살려 ‘콜 마이 네임’을 직접 부르기도 했다.
영화 <도가니>에서는 조성모가 리메이크해 빅히트 친 ‘가시나무’가 아련히 깔려 흥행몰이에 보탬이 됐다는 평을 받는다. 올해 엄정화, 황정민 주연의 <댄싱 퀸>에서 엄정화는 가수 출신의 이력을 살려 ‘콜 마이 네임’을 직접 부르기도 했다.
얼핏 조폭영화 같지만 사회물의 성격이 강했던 <범죄와의 전쟁: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에서도 런던보이스의 ‘Harlem desire’부터 함중아의 ‘풍문으로 들었소’, 이용의 ‘바람이려오’, 피버스의 ‘그대로 그렇게’, 소방차의 ‘그녀에게 전해주오’ 등 동시대를 풍미한 노래들이 쏟아져 나와 7080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근래 관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일으킨 영화들이 갖는 공통점은 크게 둘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영화가 시대와 동행하면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으로 실제 <도가니>, <부러진 화살>, <범죄와의 전쟁> 등은 실제 사회이슈를 만들어내는 파괴력을 과시했다. 다른 하나는 음악의 사용에 민감한 영화들이었다는 점이다.
영화관계자들은 음악의 비중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어떤 음악을 쓰느냐가 ‘이 영화는 다르다’는 차별화의 척도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영화평론가 전찬일씨는 “음악을 알지 못하는 제작자와 감독을 상상할 수 없는 게 요즘의 영화계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음악이 영화흥행에 열쇠를 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영화 <맘마미아>의 경우 아무리 스토리가 견고하더라도 아바의 음악이 없었다면 성립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음악의 힘은 절대적이다.
음악이 영화 속에서 빛을 발하자 올해 들어 음악 저작권자들과 제작자, 극장 간에 사용료를 놓고 대립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음악시장 종말을 운운하는 것은 어쩌면 수요자가 주목할 만한 음악을 음악계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 아닐까.
팬들은 복고적 향수를 제공하든 신선한 아이디어로 가득한 것이든 매력적인 음악에는 얼마든지 집단적으로 반응한다. 영화 속의 음악을 놓고 배경음악으로 전락했다고 할게 아니라 음악의 활용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사고의 긍정적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
음악은 언제나 위대하다.
글·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