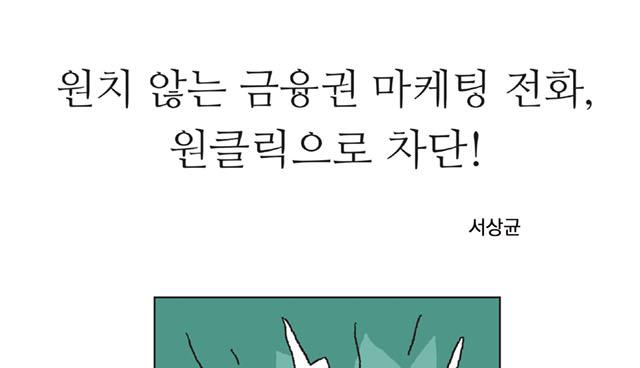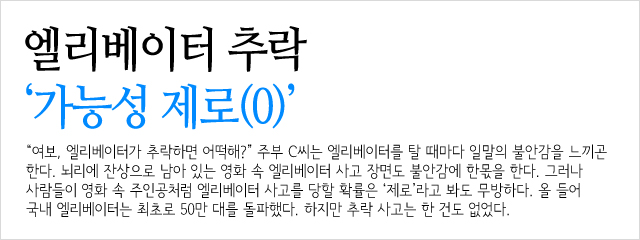
 “여보,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 어떡해?” 주부 C씨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뇌리에 잔상으로 남아 있는 영화 속 엘리베이터 사고 장면도 불안감에 한몫을 한다.
“여보,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 어떡해?” 주부 C씨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뇌리에 잔상으로 남아 있는 영화 속 엘리베이터 사고 장면도 불안감에 한몫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할 확률은 ‘제로’라고 봐도 무방하다. 올 들어 국내 엘리베이터는 최초로 50만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추락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한국인의 안전의식이 유달리 뛰어나 그런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엘리베이터의 자유 낙하 사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엘리베이터는 카(car), 즉 사람을 실어 나르는 모든 종류의 기계장치 가운데 가장 안전도가 높다. 승강기 중에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부분을 엘리베이터 카라고 부르는데 자동차나 기차, 케이블 카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사고 확률이 낮다.
사고 확률 ‘50만분의 0’이 가능한 이유는 엘리베이터 특유의 안전 설계 때문이다. 오늘날 엘리베이터의 대부분은 도르래 원리로 작동된다.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엘리베이터 카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면, 도르래의 다른 한 쪽에는 엘리베이터 카 최대 중량의 150퍼센트쯤 되는 무거운 균형추가 달려 있다.
엘리베이터 카와 추는 강철선으로 연결돼 있다. 이 강철선은 보통 철선 19~36가닥을 꼬아 한 묶음으로 하고, 이런 묶음을 다시 6~8개쯤 합해 만들어진다. 강철선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꽉 찼을 때, 즉 최대 중량에 이르렀을 때 무게의 12배 정도로 설계된다.
강철선(로프)이 이처럼 안전하게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마모나 부식 등으로 절단된 경우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카의 하강속도가 갑자기 빨라질 수 있다고 치자. 이런 상황에서는 카를 정지시켜 주는 또 다른 안전장치인 ‘비상정지 장치’가 작동된다. 또 엘리베이터 속도가 설계 속도의 1.3배를 초과하려 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된다. 이 브레이크는 일반 자동차 브레이크와 작동 원리가 유사하다. 예민한 탑승자라면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출렁’ 하고 내려갔다가 살짝 다시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 봤을 것이다. 엘리베이터 카의 바닥과 건물 층의 바닥 높이가 약간 맞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20밀리미터 전후로 바닥 높이와 차이가 생기면) 엘리베이터는 이를 자동으로 보정하도록 설계돼 있다.
엘리베이터에는 4중, 5중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탑승자들은 추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문이 열린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개문 발차’는 주의해야 한다. 개문 발차는 엘리베이터에 타거나 내릴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03년 6월 이후 건축 허가된 모든 건물의 승객용 엘리베이터에는 개문 발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사고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승강장 문 사이에 발을 밀어넣거나 몸을 기대는 행동을 삼가야 하는 이유다.
최근에는 또 비상 통화장치에 대한 승강기 검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정전 등으로 카에 갇힌 승객이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면, 시설물 내부관리자가 설령 부재 중이더라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나 자체 점검자로 자동 연결된다. 현대 도시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를 걱정하기보다는 평소 비상통화 장치 사용법을 익혀두는 등 안전한 이용 습관을 들이는 게 먼저다.
글·김창엽(자유기고가) 2014.04.07
(도움말 : 장명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연구기획위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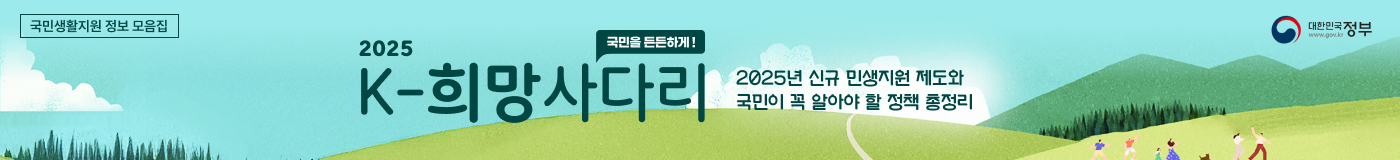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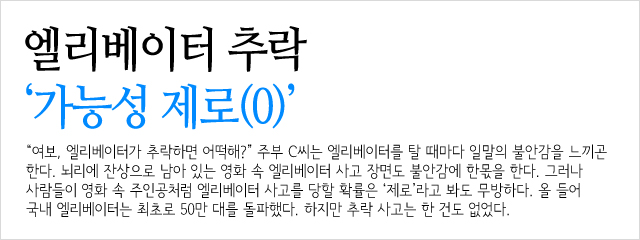
 “여보,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 어떡해?” 주부 C씨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뇌리에 잔상으로 남아 있는 영화 속 엘리베이터 사고 장면도 불안감에 한몫을 한다.
“여보,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 어떡해?” 주부 C씨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뇌리에 잔상으로 남아 있는 영화 속 엘리베이터 사고 장면도 불안감에 한몫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