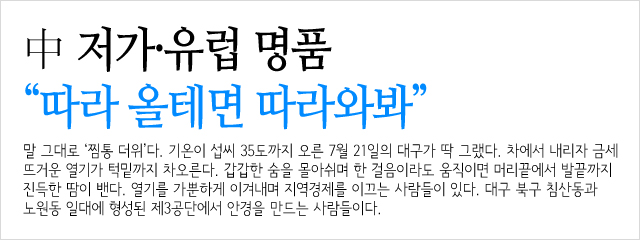
말 그대로 ‘찜통 더위’다. 기온이 섭씨 35도까지 오른 7월 21일의 대구가 딱 그랬다. 차에서 내리자 금세 뜨거운 열기가 턱밑까지 차오른다. 갑갑한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진득한 땀이 밴다.
열기를 가뿐하게 이겨내며 지역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
대구 북구 침산동과 노원동 일대에 형성된 제3공단에서 안경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공단 구석구석에 있는 크고 작은 공장에서 안경을 만든다. 누구는 테의 외형을 짜고 누구는 나사를 만든다.

또 누구는 코를 조립하며 장석을 만드는 일에 몰두한다. 그럴듯한 외형을 갖춘 공장이 있는가 하면 간판도 없이 조그마한 골방에서 책상 하나를 놓고 작업에 매진하는 사람도 있다. 작업장에 들어서면 도시의 뜨거움에 기계가 내뿜는 열기까지 더해져 용광로 안으로 들어서는 느낌이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많은 사람들의 눈을 밝히는 일에 열정을 쏟는다.
이 뜨거운 곳이 한국 안경산업의 메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안경의 90퍼센트가 대구 안경산업특구에서 만들어진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안경을 만드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안경테 수출액만 1억5천만 달러다. 렌즈와 안경 액세서리까지 포함하면 6억 달러다. 2천명이 넘는 기술자들이 값싼 중국 안경에 맞서 생존을 위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70년 역사 지닌 ‘대구 산업의 원조’ 자부심
대구에서 안경산업이 태동한 것은 70여 년 전의 일이다. 안경테 생산 기술자인 고(故) 김재수 선생이 1945년 대구 북구에 국내 최초의 안경공장을 설립한 게 시작이었다. 일본의 최대 안경 생산기지인 후쿠이현에서 안경테 제조기술을 익힌 그는 해방 직전 한국으로 건너왔다. 이후 안경산업은 대구를 대표하는 산업이 됐다. 안경 기능공들은 6·25전쟁 이후 생겨난 섬유산업보다도 역사가 길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 대구의 안경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20년 넘게 연평균 20~30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다. 당시 2천~3천명의 직원이 일하는 공장도 여러 개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의 안경산업에 위기가 찾아왔다. 값싼 중국 안경이 시장에 대량 유입되어서다. 거기에 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의 명품 안경 브랜드까지 가세해 국내 안경산업은 점차 설 자리를 잃었다.
 많은 공장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기술을 가진 사람들 상당수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많은 공장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기술을 가진 사람들 상당수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근처의 작은 공간을 빌려 자신이 가진 기술로 생계를 이었다. 대구 안경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의 80퍼센트 이상이 직원 수 5명 미만인 영세 사업자들인 이유다. 이들은 각자의 장기를 살려 안경을 만든다.
하나의 안경이 만들어지기까지 250~280가지 공정이 필요하다. 기술자들은 각자 하나의 공정을 책임진다. 안경테를 용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용접만 하고 어떤 이는 하루 종일 나사만 만든다. 신기에 가까운 손 기술로 안경 코를 붙이기 위한 구멍만 뚫는 사람도 있다. 이들이 이어달리기를 하듯이 작업에 매진해 하나의 안경을 완성하는 것이다.
“안경 제조의 꽃은 용접이죠. 다른 공정은 기계로 할 수 있어도 용접은 일일이 다 손으로 해야 하거든요.” 용접 기술자 고재호씨의 말이다. 하나의 기술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 각자 맡은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가 대구 안경산업단지의 기술자가 된지는 8년이 지났다. 전자회사에 다니다 20년간 안경을 만든 형 고재동 씨의 권유로 일을 시작했다. 많게는 하루에 3천개의 안경코 부분을 용접한다. 지루하고 고된 일이지만 고 씨는 항상 밝다.
“손가락에 화상 몇 번 입으니까 기술자가 되어 있던데요(웃음). 내 기술이 있으니 남 눈치 안 보고 일해서 좋습니다.”
장석을 만드는 김문호 씨도 있다. 장석은 안경의 몸통과 다리를 잇는 조그마한 쇠를 말한다. “대부분 기계가 만들어 큰 기술은 필요하지 않겠다”는 기자의 말에 김 씨는 버럭 화를 낸다. “세상에 기계 혼자서 하는 일이 어디 있어? 군데군데 사람 손이 가야 하는 곳이 한두 개가 아냐. 자칫 딴 데 정신을 팔면 다치기도 쉽다고.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냐.”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다.
70년간 묵묵히 쌓아올린 내공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침체기를 겪었던 국내의 안경산업은 2007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가볍고 탄성이 좋은 플라스틱 소재의 안경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안경을 싸게 만들수는 있었지만 질 좋은 안경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신소재를 결합해 손기술 좋은 국내 장인들이 만든 안경의 품질을 따라오지 못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대구의 안경은 명품 브랜드 안경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착용하는 안경의 대부분도 국산 제품이다. 제조 기술로 콧대가 높은 일본 사람들이 쓰는 안경의 절반이 한국에서 생산됐다.
유명인이 쓰는 안경도 알고 보면 대부분 국산
최근 대구 안경거리의 분위기는 다소 어둡다. 몇 개월 사이 여러가지 악재가 겹쳐서다. 안경테를 수출하는 신화인터내셔널 이성준 대표는 “14년째 안경을 수출하는데 요즘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술력에서 한참 뒤처져 있던 중국이 그 격차를 상당히 좁혀왔다. 지난해 말부터는 제법 그럴듯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환율문제가 겹치면서 수출에도 타격이 크다. 거기에다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국내 경기가 눈에 띄게 침체되면서
좀처럼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몇몇 공장이 문을 닫으니 그 릴레이 선상에 있던 영세 사업자들도 덩달아 어렵다.
그럼에도 이성준 대표는 희망을 노래한다. “70년 동안 안경으로 먹고 산 동네인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요. 오뚝이처럼 일어날 겁니다.”
글·박성민 기자 201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