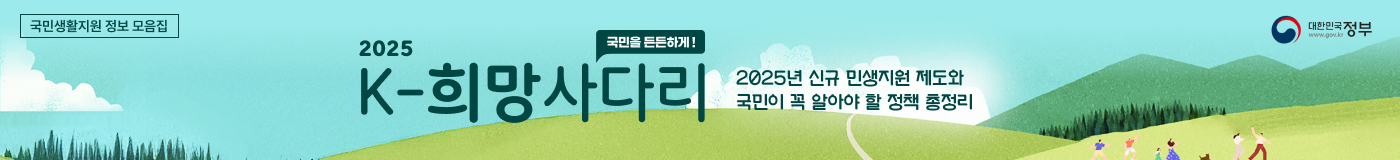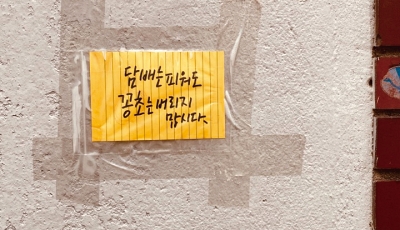2003년 봄, 저의 첫 반려견 ‘다래’를 입양했습니다. 제가 13세 때 데려와 만 13년을 살고 떠나보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가족이었죠. 그즈음 제 또래 친구들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초등학생일 때 반려견을 입양해 평균 수명 이상 함께 살다가, 20대 중후반 들어 본가에서 독립할 때쯤 떠나보냈어요.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붐이 시작된 시기는 2000년대 초중반. 반려동물 붐이 시작된 지 20년 가까이 지났고 반려견과 반려묘의 평균수명이 15년 정도 되니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반려동물을 잃어 슬픔을 겪은 분이 많았던 거예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만큼 슬픔도 컸습니다. ‘펫로스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한 시점도 이때부터였거든요.
펫로스 증후군은 반려동물이 사망한 뒤에 겪는 정신적 어려움을 뜻합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우울증이 되기도 해요. 해외에서는 펫로스 증후군 연구가 활발합니다. 특히 미국, 유럽, 호주 등에는 펫로스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의료센터가 있고 정신과 상담을 통해 약 처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서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일부 기업과 기관에서는 벌써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와 유급휴가를 복지로 제공하는 회사, 펫로스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상담 지원 등이 그 사례예요. 2021년 서울 서초구에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펫로스 상담 모임을 열기도 했어요.
물론 모두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감정의 크기에는 기준이 없기에 이러한 변화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사회적 변화가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일 거예요. 펫로스 증후군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업과 제도 등 모든 방면에서 말이죠.
국토교통부도 달라진 생활문화를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에요. 소규모 동물병원이나 동물미용실을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작은 규모의 동물병원이라면 전용거주지역에도 들어올 수 있게 돼요.
사실 시장의 관점에서는 반려동물 문화가 이미 중요한 테마예요. 1인가구와 딩크족(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이 많아지면서 2027년에는 국내 펫시장 규모가 6조 원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 흐름이라 글로벌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2027년 35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해요. 펫푸드는 물론 펫 전용 의류, 유모차, 샴푸, 가구, 보험,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려동물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저는 1인가구로 독립 후 ‘목성’이라는 이름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퇴근길에 통닭을 사오던 아버지처럼 저는 퇴근길에 펫용품숍에 들러 목성이 간식을 사가곤 합니다. 혼자 노는 목성이를 보며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둘째를 데려와야지’ 하며 나름의 가족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언젠가 다래처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오겠지만 잠시 함께하는 생이라도 ‘나와 함께 해서 좋았다’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떠난 후의 슬픔을 달래는 방법도 이제는 잘 아니까요.

박진영
금융·경제 콘텐츠를 26만 MZ세대에게 매일 아침 이메일로 전달하는 경제미디어 <어피티> 대표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