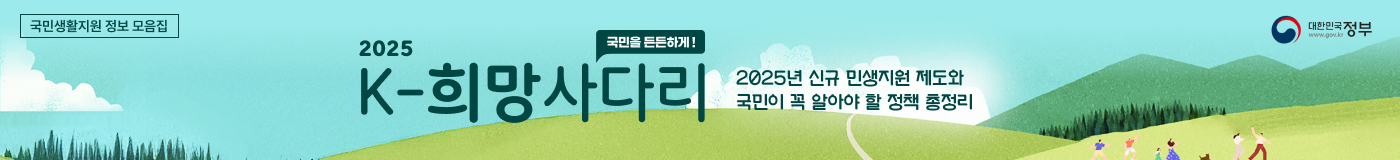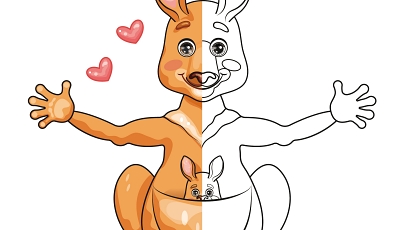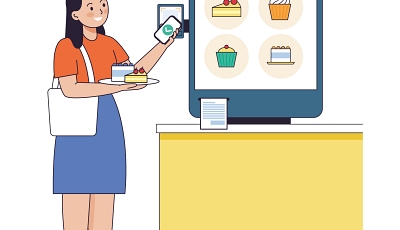청년(靑年)은 인생에서 생기 넘치는 시기예요. 청년기본법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결혼도 늦어지고 취업 시기도 다양해지면서 청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 까닭이죠.
청년정책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취업 장려금부터 월세 지원, 창업 지원금까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번 생생 MZ 톡에서는 청년 나이 범위를 주제로 각자의 삶에서 체감한 청년정책과 나이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참가자
엠?가뭐다냐(24세, 취준생)
경프로도(26세, 사무직)
하니(31세, 사무직)
나다(34세, 사무직)
경일(32세, 사무직)
Q. 청년기본법상 청년 범위(만 19~34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경일
취업 연령이 높아지면서 30대 초반 신입도 흔해졌어요. 이들이 자리를 잡는 기간까지를 청년이라고 고려했을 때 10년 정도는 유예를 둬야 하지 않을까요? 사기업에서도 청년 범위를 점점 늘리더라고요. 제가 이용하는 통신사도 지난해 청년요금제 연령을 만 31세에서 34세로 상향했어요. 정부도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엠?가뭐다냐
40세까지는 청년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청년지원제도에서도 39세까지를 청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도마다 기준이 달라 헷갈릴 때도 있어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39세까지 가능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만 34세까지거든요. 일관된 기준이 생기면 좋겠어요.
하니
저도 현재 기준은 꽤 적절하다고 봐요. 34세 이후부터 삶의 형태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부터는 청년정책보다는 신혼부부나 1인가구처럼 삶의 형태에 맞춘 정책을 펼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경프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신혼부부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평균 초혼 연령이 여 31세, 남 34세인데 결혼 후 가정을 이루면 더 이상 청년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결혼 연령이 더 늦어진다면 그에 맞춰 기준을 조정할 필요는 있겠죠.
Q.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 나이 범위가 다른데 통일해야 할까요?
나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서는 45세도 청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각 지역의 인구구조나 정책 목표가 다르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기준을 조정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다만 세법처럼 국가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관련된 청년 범위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프로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전에 경기도에서 지원받던 혜택을 서울로 이사오면서 못 받게 된 경험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청년 나이 기준이랑 지원 조건이 달라서 이사 갈 때마다 일일이 기준을 찾아보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하니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봐요. 시골에서는 50대도 젊은 축에 들잖아요. 인구 분포나 소득수준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하면 좋겠어요.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은 좀 더 높게 잡고 젊은 인구가 많은 도시는 현행대로 가는 거죠.
경일
정부 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건 만 34세까지, 또 어떤 건 만 39세까지여서 괜히 희망고문 당하기 싫거든요. 특히 청년 주거 지원처럼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정책들은 나이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면 좋겠어요.
Q. 나이 때문에 아쉽게 놓친 청년정책이 있나요? 도움이 됐던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나다
10년 전, 제가 24세 때 청년 지원금으로 받았던 100만 원은 큰 도움이 됐어요. 첫 직장이 중소기업이었는데 그 시기에 받았던 혜택들도 정말 유용했고요. 마이스터통장(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월 5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이 큰 도움이 됐거든요. 현재도 K-패스 지원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세액공제 등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경일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통해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예전에 받았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과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큰 도움이 됐어요.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바우처에도 관심이 많아요. 우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 정부가 연계해주는 상담 프로그램은 왠지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하니
19세 청년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정말 부러웠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 즈음에 보고 싶은 공연이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보지 못했거든요. 그때 이런 지원을 받았다면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도 얼마 전 재취업을 준비할 때 지자체에서 제공한 청년수당은 큰 도움이 됐어요.
*어피티는 MZ 맞춤형 경제 콘텐츠를 뉴스레터에 담아 매일 아침 50만 구독자에게 보내는 MZ세대 대표 경제 미디어입니다.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