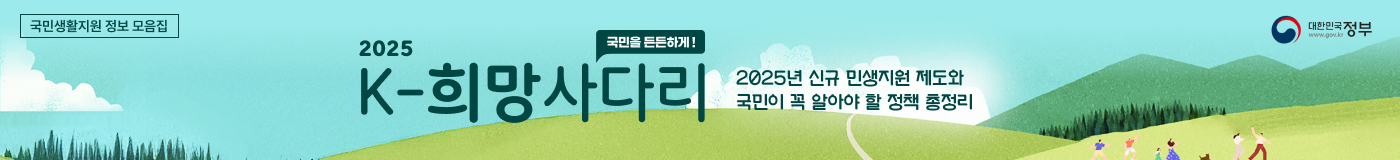[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어릴 적 우리의 전담 이발사는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날을 골라 우리를 마루 끝에 불러 앉히고 차례로 보자기를 씌워 날이 긴 재단용 가위로 머리를 잘라 주셨다. 그때마다 가위를 통해 울리던 싹뚝거리는 느낌과 소리가 그리 싫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지자 어머니는 아랫 동네의 가까운 친척에게 정기적으로 쌀 몇 되씩을 주고 우리의 머리를 맡겼다. 그 친척은 물론 무허가 이발사였지만, 솜씨도 좋았고 비록 집에서 만든 것들이나마 제법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어린 마음을 끌어들인 것은 나무로 만든 의자였는데, 뒤로 구멍을 여러 개 뚫어 그것으로 등받이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 의자는 머리를 깎지 않을 때도 우리의 좋은 놀이도구가 되어 때로는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행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다 그 친척의 형편이 조금은 나아져 남의 머리를 만지지 않아도 살 만큼 되자 어머니는 역전거리에 있는 이발관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그 이발관은 기계라고는 탈곡기나 풍차, 새끼 꼬는 기계 정도만 보아온 눈에는 제법 으리으리한 곳이었다.
[SET_IMAGE]4,original,center[/SET_IMAGE]우선 벽면을 가득 채운 큰 거울과 그 사이사이에 걸려 있는 멋진 풍경의 그림들, 무엇이라고 쓴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자를 휘갈긴 휘호, 소독약 냄새가 제법 풀풀거리던 조그만 소독함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반짝이는 가위와 이발기계들까지…. 그곳의 풍경은 머리를 깎는 30분 정도의 시간에는 모두 기억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복잡다기했다. 하기는 집에도 걸려 있던 똑같은 달력마저 그곳에서는 다르게 보였다.
그곳에서도 역시 최고의 관심사는 빙글빙글 돌아가기도 하고 위아래로 오르내리기도 하는 쇠로 된 의자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 교장실에서 본 교장 선생님의 나무로 만든 회전의자보다 좋게 보였으니까. 그러나 돌아보건대 그 의자에 제대로 앉아본 기억은 없다. 이발사 아저씨는 늘 널빤지 하나를 팔걸이에 걸쳐 놓고 그 위에 우리를 앉힌 다음 이발을 했으므로….
전라남도 강진읍 임천리에 있는 ‘재건이발관’은 그 이름에서부터 개발시대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이발소 안의 빛바랜 그림과 ‘칠전팔기’‘가화만사성’이라는 한자성어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는 시구 등이 담긴 액자가 눈길을 끈다.
재건이발관을 운영하는 윤순칠(75) 옹은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56년째라고 한다. 그러나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손님이 빠져 나가는 것이 그로서는 아쉽기만 하다.
언제부터인지 거리에서 이발관 표시가 사라지더니 이즈음에는 그나마 대형 체인점 형태의 현대적 이발관이거나 목욕탕 한쪽에 마련된 이발관을 제외하고는 보기조차 힘들게 됐다. 싸고 간단하게 머리를 깎아 주는 미용실에 고객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리라. 더불어 동네 아저씨들의 구수한 입담이 오가던 넉넉한 시골 이발관의 정취도 이제는 사라져 가는 추억이 되고 있다. [RIGHT]사진·권태균 / 글·이항복[/RIGHT]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