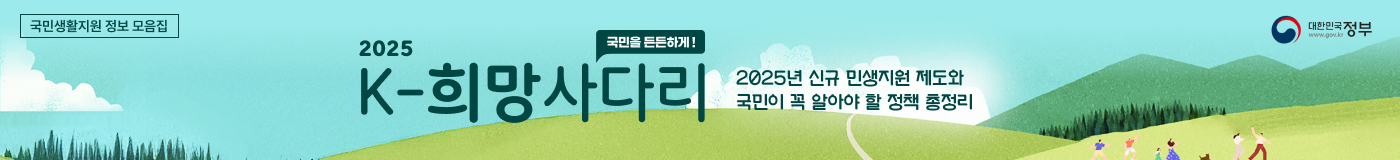‘서유기’는 명대의 작가 오승은의 창작품으로 중국 4대 기서(奇書)로 손꼽힌다. 당대의 승려 삼장법사가 황제의 칙명을 받고 불교 경전을 구하기 위해 인도에 다녀온다는 것이 소설의 줄거리다. 작가는 실존인물의 역사적 행보를 바탕으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 가상의 제자들이 삼장법사를 호위한다는 허구를 더해 여행길에서 겪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렸다. 그중 삼장법사 일행이 화염산(火焰山)에 도달했을 때였다. 요괴의 방해로 사방이 화염에 휩싸여 도저히 산을 넘을 수가 없었다. 실제 화염산도 붉은색의 바위산이 마치 불에 타서 이글거리는 듯 기괴하게 생겼다. 손오공은 나찰녀가 가지고 있는 파초선으로 그 불을 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찰녀와 싸워 파초선을 얻는다. 이 파초선을 부치자 비가 내려 화염산의 불이 꺼졌고 삼장법사 일행은 무사히 서역행길에 오를 수 있었다.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지붕에는 ‘서유기’에 등장한 인물의 형상들이 올려져 있다. 이들을 ‘잡상(雜像)’이라고 한다. 잡상은 진흙으로 만든 테라코타로 ‘상와(像瓦)’ 또는 ‘어처구니’라고도 부른다. 지붕의 맨 윗부분인 용마루의 양쪽에 치미가 들어간다면 용마루에서 내림마루를 거쳐 서까래와 연결되는 추녀마루 위에는 잡상이 장식돼 있다. 잡상은 궁궐의 정전, 정문, 침전, 누정을 비롯해 도성의 정문, 종묘, 성균관, 동궐 등 중요한 건물 지붕에 올려놓았다. 잡상의 개수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잡상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조선시대 건물에서 주로 볼 수 있지만 불교국가였던 고려시대 때부터 등장한다. 고려시대 때 창건된 양주 회암사 절터에서도 다량의 잡상이 출토됐다.
삼장법사 일행의 잡상들은 그들이 화염산에서 요괴를 물리쳤듯이 궁궐에 들어오는 잡귀나 사악한 기운들을 물리쳐 달라는 염원에서 조각된 듯하다. 그 사악한 기운은 다름 아닌 화재일 것이다. 목조건축의 최대의 적은 화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잡상은 건물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한 일종의 신상(神像) 혹은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다. 승려인 삼장법사가 갑옷을 두른 장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특이한 형상의 동물들이 섞여 있는 것만 봐도 벽사적이고 주술적인 의미가 강했다는 뜻이다. 삼장법사 일행은 불교와 관련되지만 유교국가인 조선의 정궁에서도 여전히 인기를 얻었다. 불교적인 인물이 유교적인 건물에 장식돼 도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쓸모가 있거나 사람을 이롭게 한다면 굳이 종교나 이념에 의해 배척하지 않는 융통성이 드러난다.
중국에서는 잡상을 ‘주수(走獸·길짐승)’라고 부른다. 조선시대의 잡상은 ‘서유기’의 등장인물들이 주로 형상화됐지만 명칭을 파악하기 힘든 동물들도 간혹 보인다. 중국의 주수는 선인, 용, 봉, 사자, 기린, 천마 등 도교의 상징성이 강한 동물들이 등장한다. 반면 일본의 건물에는 잡상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동양 삼국이 모두 기와지붕을 사용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조선의 잡상이 둥글둥글하고 익살스러우며 친근하다면 중국의 주수는 무섭고 과장적이며 괴기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귀신을 만나도 장난치며 놀다 헤어질 것 같은 익살스러움은 신라 때 본 황룡사 절터의 치미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특징이다. 세종대왕이 ‘나랏말싸미(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서로 통하지 않아)’ 한글을 창제했듯 우리 또한 우리만의 문화를 창작할 차례다. 삼장법사 일행 대신 우리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잡상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조정육 미술평론가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