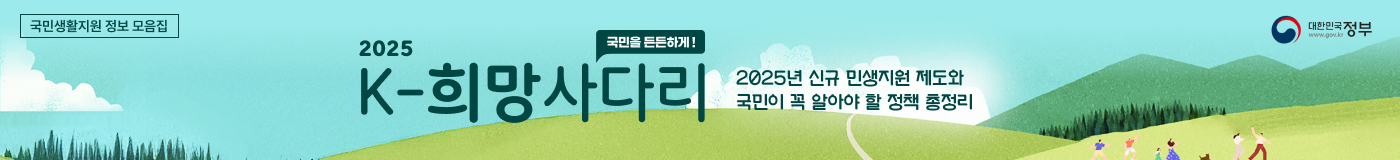요즘 시골은 물론 도시 화단이나 공터에서도 나팔꽃과 비슷하게 생긴 연분홍색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다. 메꽃의 계절이 온 것이다.
메꽃은 나팔꽃과 비슷하게 생겨 사람들이 그냥 나팔꽃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팔꽃은 인도가 원산지인 귀화식물이지만 메꽃은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온 원조 우리 꽃이다. 토종 메꽃이 귀화종 나팔꽃에 밀린 것이다.
나팔꽃은 메꽃과 덩굴식물로 화단이나 담장 근처 등에 심어 가꾸는 꽃이다. 가요 가사에도 나오듯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꽃잎을 오므린다. 꽃 색깔은 주로 빨간색 또는 짙은 보라색이다. 반면 메꽃은 한낮에도 피어 있다. 꽃 색깔도 연한 분홍색이라 은근해서 좋다.
나팔꽃과 메꽃은 꽃 색깔만 아니라 잎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나팔꽃 잎은 심장 모양이 세 개로 갈라지는 형태지만 메꽃 잎은 창과 같이 생긴 긴 타원형이고 끝이 뾰족하다. 또 나팔꽃은 한해살이풀이지만 메꽃은 여러해살이풀이다. 그러니까 나팔꽃은 씨를 뿌려야 나지만 메꽃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봄이면 뿌리줄기에서 새싹이 올라온다. 이처럼 메꽃은 심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보아주지 않아도 길가에서 저절로 자라서 꽃을 피운다.
박완서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엔 어릴 적 군것질거리로 싱아가 나오지만 삘기·찔레순·산딸기와 함께 ‘메뿌리’도 나온다. 메꽃의 뿌리를 ‘메’라고 하는데 전분이 풍부해 기근이 들 때 구황식품으로 이용했다. 메에 영양분을 저장해 매년 씨를 뿌리지 않아도 봄에 새싹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메꽃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애기메꽃이다. 메꽃보다 잎과 꽃이 작고 잎 아래쪽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갈라져 있는 형태다. 메꽃은 튀어나온 부분이 갈라져 있지 않다. 잎이 하트 모양으로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갯메꽃도 있다.
글·사진 김민철
야생화와 문학을 사랑하는 일간지 기자. 저서로 ‘꽃으로 박완서를 읽다’, ‘문학 속에 핀 꽃들’, ‘꽃을 사랑한 젊은 작가들’ 등 다수가 있다.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