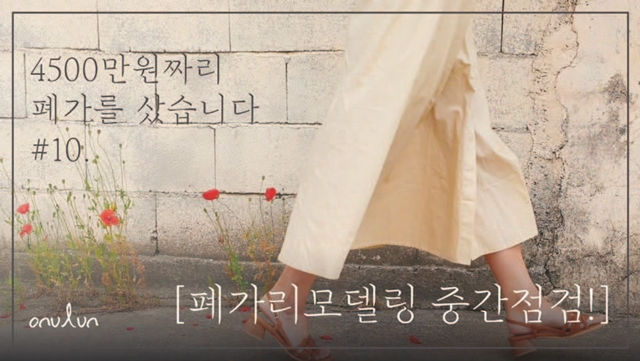 ▶‘오느른’ 유튜브 화면
▶‘오느른’ 유튜브 화면
사람들과 자주 ‘요즘 유튜브에서 뭘 보느냐’는 얘기를 주고받는다. 이전에는 흔치 않은 풍경이다. 그만큼 유튜브가 일상화되었다고 할 수도, 혹은 유튜브가 방송을 대체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기 콘텐츠를 얘기하자면 누군가는 예능 프로그램을, 누군가는 옛날 방송의 클립을, 혹은 음악 목록을 얘기하는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요새는 <오느른>이라는 힐링 다큐 프로그램을 본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유명하다. 30대 MBC 피디가 김제의 오래된 집을 사서 고치는 과정을 개인방송으로 찍었고 그 내용이 입소문을 타면서 16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방송국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개인방송 채널 <오느른>은 전라북도 김제의 어느 시골 농가가 배경이다. 코로나19로 준비하던 프로그램이 엎어지고 무기력에 시달리던 피디가 우연히 들른 동네의 한 폐가에 반해서 산 집이다. 대지 991㎡(300평)에 붙은 집 한 채를 4500만 원에 사서 인테리어를 좀 예쁘게 한 뒤 주말에 혼자 또는 친구들과 치유의 시간을 보내야겠다, 라는 게 처음 생각이었다.
시골 폐가를 고쳐 사는 이야기 ‘오느른’
<오느른>은 ‘오늘을 사는 어른들’이라는 뜻이다. 내일이나 미래 같은 말 대신 ‘오늘’의 자신에게 집중하자는 맥락으로 붙은 제목으로 내용은 좀 심심하다. 주인공이 새로 산 ‘폐가’를 살 만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을 찍고, 그러는 동안 인연을 맺게 된 이웃들과 만들어가는 사소한 에피소드가 전부다. 물론 그 과정이 험난하고, 이웃으로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70년 되었다는 95세 ‘동네 친구’와 고양이가 있다. 심지어 <오느른>에는 대사 대신 자막만 나온다. 영상 에세이 같다.
집을 계약한 건 2020년 4월이고 첫 영상은 6월 5일에 올라왔다. 10회가 될 때까지 2000명 정도에 머물던 구독자 수는 몇 주가 지나는 동안 9000명으로 늘었다가 최근 일주일 만에 16만 명으로 늘었다. 그사이 주인공은 불어나는 수리비를 감당하기 위해 서울 전셋집을 빼고, 퇴사 대신 회사의 소속을 바꿨다. 교양국 피디에서 MBC 소속 창작자가 된 것이다. 댓글창에는 ‘시골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 ‘여자 혼자 시골에서 사는 게 걱정된다’는 훈수부터 ‘보는 내내 힐링된다’거나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해서 보다 보니, 웃다가 울다가 1화부터 정주행 중이다’는 댓글까지 온갖 반응이 살아 숨 쉰다.
<오느른>의 힘은 바로 이 살아 숨 쉬는 댓글들이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주인공이 가감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었기 때문이다. 개인방송에서는 ‘척’이 통하지 않는다. 뒷광고 논란이나 인성 논란은 모두 앞과 뒤가 똑같아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것도 전략일까?
1화부터 최근 18화까지 보면서 새삼 <오느른>의 매력 혹은 흡입력은 바로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 돌파해낸다는 점을 깨닫는다. ‘오래된 것이 좋다’는 기준을 지키기 위해 집에서 나온 쓰레기 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 깨끗이 닦아둔다. 지붕 공사를 하다가 이 집이 ‘초가집’이라는 걸 발견한 뒤에 그럼에도 ‘옛날 집의 느낌을 살린다’는 기준을 지키기 위해 전셋집을 빼기로 한다. 단열을 하면 벽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 겨울까지 기다려보자’고 결정한다. 모두 처음의 마음, 그러니까 ‘이 버려진 집이 주는 평화로움’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다.
 ▶‘오느른’ 페이스북
▶‘오느른’ 페이스북
32세 피디의 별거 없는 일상이 만든 파장
‘시선이 참 곱다’는 것은 <오느른>의 구독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 고운 시선은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원래의 성품에 가까울 것이다. 그것이 2000명에서 16만 명으로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일 것이다. 물론 MBC가 여러 플랫폼과 계약하고 홍보를 한 까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마케팅도 상품이 좋아야 먹힌다.
그리고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집을 고치다가 그걸 아예 방송국의 프로그램으로 기획, 제안하는 과정에서 교양국 피디의 소속이 개인방송 팀 소속으로 바뀌는 전환은 앞으로 방송과 제작 인력이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는지에 대한 힌트도 준다. 상황이 달라지면 회사와 나의 관계는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누구나 품게 되는 문제다. <오느른>은 바로 이 점을 구체적으로 건드리고 대안을 제시한다. 소속이 바뀐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주체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시리즈는 만드는 사람의 진심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의 시장이란 그런 곳이다. 여기서는 진심밖에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토록 연약한 ‘진심’이라는 말, 혹은 솔직함이야말로 창작자의 고유한 개성이 된다. 따라서 주인공이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며 만든 <오느른>의 최종 기획안의 첫 번째 항목이 마침내 ‘계획 없음’이라는 것도 납득이 된다. 계획이 없으므로 이벤트가 생기고, 이벤트가 모여서 에피소드가 되기 때문이다.
새삼 우리는 이 불확실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떠올린다. 계획이라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전략이라는 게 과연 먹히기나 할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단 말인가. 요컨대 나라면 4500만 원을 어떻게 썼을까. 바야흐로 2020년의 미디어는 이미지와 실체, 본심과 가식, 대화와 마음을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오느른>을 보면서 어렴풋이 짐작해본다. 이 경계와 모순의 세계에서, 김제의 한 마을에 정착한 32세 피디의 별거 없는 일상이 만드는 파장을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아 뭔가 잘못되어 가는 느낌’ 같은 자막에 풉 하고 웃다가 ‘오느른 조금 지쳤나 봐요. 이런저런 고민들도 있지만, 철부지는 적당히 행복합니다’ 같은 자막에는 또 위로받았다가, 그냥 별거 없이 쏴아아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밭을 보면서는 울어버리고 만다. 방송 다큐 같은데 또 관찰 예능 같으면서도 <인간극장> 같기도 한, 이 심심하면서 흥미진진한 개인방송 콘텐츠를 보면서 엉엉 울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머쓱한 마음으로 눈물을 닦다 말고 아, 어쩌면 이게 바로 16만 구독자가 <오느른>을 보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차우진_ 음악평론가. 미디어 환경과 문화 수용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청춘의 사운드> <대중음악의 이해> <아이돌: H.O.T.부터 소녀시대까지…> <한국의 인디 레이블> 등의 책을 썼고, 유료 콘텐츠 플랫폼 ‘퍼블리’에서 <음악 산업, 판이 달라진다> 리포트를 발행했다. 현재는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스타트업에서 팬 문화, 콘텐츠, 미디어의 연결 구조를 고민 중이다.
차우진_ 음악평론가. 미디어 환경과 문화 수용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청춘의 사운드> <대중음악의 이해> <아이돌: H.O.T.부터 소녀시대까지…> <한국의 인디 레이블> 등의 책을 썼고, 유료 콘텐츠 플랫폼 ‘퍼블리’에서 <음악 산업, 판이 달라진다> 리포트를 발행했다. 현재는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스타트업에서 팬 문화, 콘텐츠, 미디어의 연결 구조를 고민 중이다.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