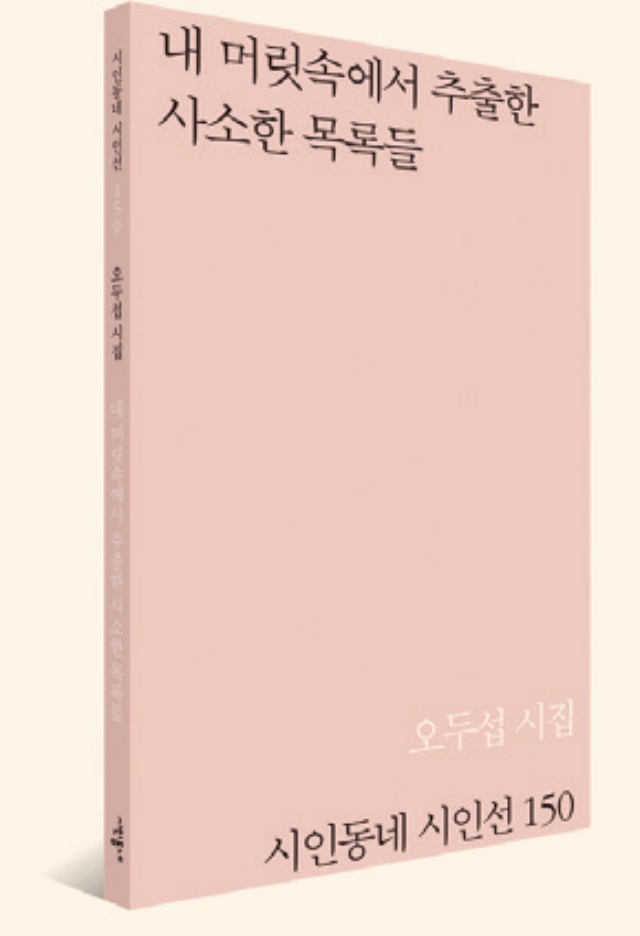▶오두섭 시인│오두섭
시집 〈내 머릿속에서 추출한…〉 펴낸 오두섭 시인
마음 쉴 짬을 내기 어려운 시절 쏜살같은 삶의 속도가 코로나19로 잠시 멈춤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시’는 어떤 의미일까. “다시금 내 가족과 이웃, 친지들과 지인들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소낙비 테러리스트>(2010)와 <내 머릿속에서 추출한 사소한 목록들>
(2021) 두 편의 시집을 낸 오두섭 시인은 말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이웃들과 함께 약국 앞에 긴 행렬을 만들던 일,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하던 거리두기와 주먹 악수, 마주 오는 사람과 눈길이 만나는 마스크, 벌써 아홉 번이나 미뤄진 모임 약속, 습관화되려는 집 밥과 혼밥, 애써 그려보는 군중 속의 나, 애꿎은 누리소통망(SNS)만 쳐다보다가 쓸쓸히 늙어가는 형제자매들, 얼음 속에 갇혀 버린 축제의 밤, 멈춰버린 노랫소리, 일찍 불이 꺼지는 동네 식당과 한적한 밤거리, 홀로 하늘을 밝히던 반달, 속절없이 피고 지는 봄꽃….”
오두섭 시인의 눈에 들어온 코로나 시대의 사소한 아니 결코 사소하지 않는 목록들이다. 시인의 목록은 코로나19가 들이닥친 이 지상의 삶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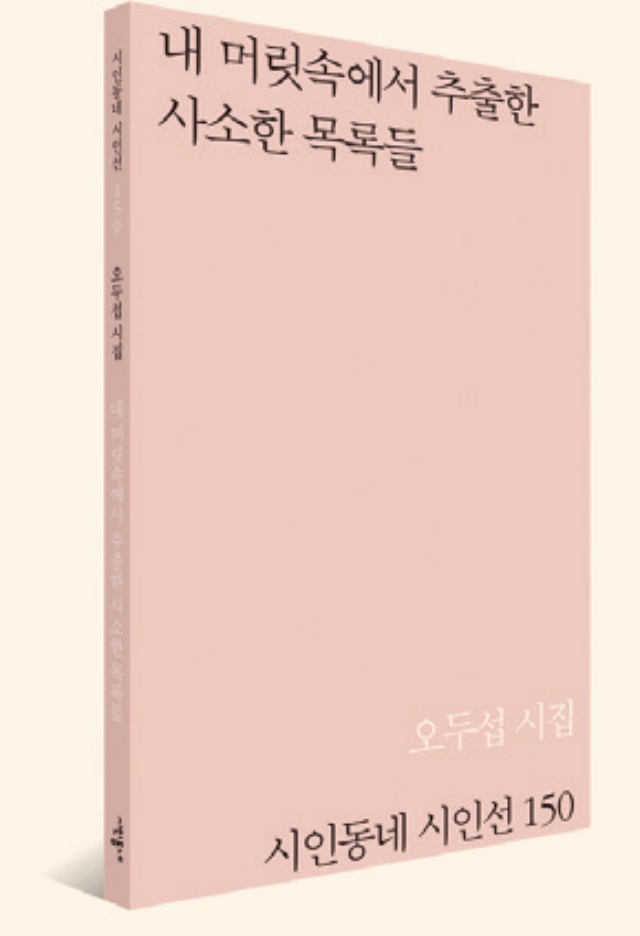
▶1979년 <매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오두섭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시는 영혼의 백신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바이러스한테 꼼짝 못 한다는 것인데요.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일상에서 내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감염으로 목숨을 잃거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 시시각각 그것이 내 삶의 불안으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비대면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일정한 거리를 둔 단절된 생활은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좀 더 크게 보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같은 질문들이죠.”
오 시인은 코로나19를 “지구상의 인류가 처음으로 직면한 최대 규모의 일상 파괴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이제 안부를 묻는 인사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가정과 일터의 풍경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다시 봄이 왔건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감염병)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은 끝나지 않았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코로나19 환자 수에 전국적으로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어디든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하고 수도권의 카페나 음식점은 밤 10시 이후 영업할 수 없다. 거리 곳곳에는 건물에 임대와 매매가 나붙어 있는 게 일상 풍경이 되어버렸다. 코로나19가 일으킨 황폐해진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인 오두섭의 두 번째 시집에 실린 ‘눈 내리는 감염주의보’ 한 대목을 옮겨본다.
주말 공연을 환불한 프리마돈다 Q는 백신을 거부 중이며/ 환각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수십 광년 날아와 눈송이로 침투하는/ 미확인 우주요정(UFE)의 소행임이 밝혀졌는데요.// 삼류 시인을 비롯해 화가 만화가 단역배우 SF작가 게이머 등등/ 각기 다른 증세를 보이는 것 또한 미스터리한데요.// 이들 중 시인 몇은 자신의 종적을 지워버리기도 했다지요.// 그 행성에서 지구인의 특정 영혼을 수집해 간다는/ 충격적 소문이 쏟아지는 오늘밤,/ 당신의 텅 빈 영혼을 한번 살펴보심이.
오두섭 시인은 “잠시 잠깐이라도 지친 영혼을 달래는 젤리 같은 것, 소금 같은 것”이라며 ‘영혼의 백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시를 권했다.
그의 시 ‘우표’를 읽으며 누군가는 지나간 시간을 추억할 수도 있다.
내게서 멀리 있는 계절에 머물러 주는 당신이 고맙던 시절이 있었다/ 일기장 속에 아직도 까슬하게 살아있는 당신의 테두리/ 저문 밤 부칠 데 없는 이름 몇 개 달빛에 실어 날려보낸다/ 너의 길목을 서성거리며 긁적인 문장들이 오늘에야 되돌아오는데/ 이토록 선명하게 찍혀 씻기지 않는 지문처럼 당황스럽던/ 젊은 날의 소인(消印)이여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법
‘생존을 위한 방법론’를 읽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본다.
오늘밤 누가 내 삶의 쓸쓸함을 묻는다면/ 태어나서 처음 배운/ 눈물을 글썽이는 방법으로/ 그것이 굳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삶에게 묻다’를 읽으며 사는 게 무엇 같더냐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해외를 떠돌다가 온 문(文)이 천천히 잔을 내려놓는다./ “내 삶, 이제야 텅 비워졌어. 잠시 잠깐 출렁대던 현실이 물거품처럼 지나가고 있어.”// 못 말리는 골초 오(吳)는 담배연기 내뿜듯 허공에다 소리쳤다./ “삶이여, 이제 네가 나에게 물어봐 다오!”
시를 접하는 것은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한 가지 방법이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달라진 일상이 지속되며 겪는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대면 만남이 어려워진 코로나 시대. 사람과 사람이 나란히 걷는 일은 불가능할지라도 시는 오랫동안 사람의 곁에 머무를 수 있다. 시 한 편 읽어보실래요?
심은하 기자



 ▶오두섭 시인│오두섭
▶오두섭 시인│오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