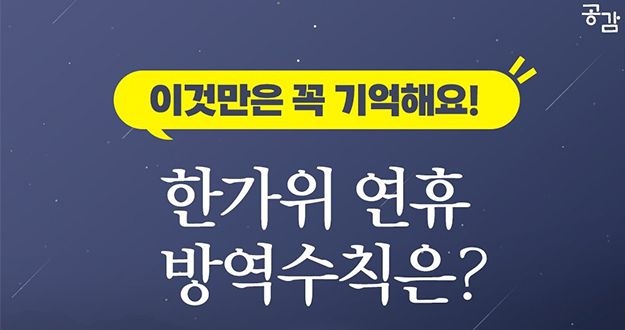해마다 추석은 온다. 다른 해보다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추석을 생각하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든다. 대체 추석은 누구를 위하여 오는가?
적어도 여자를 위해 오는 추석은 아닌 것 같다. 결혼한 여자는 누군가의 며느리일 텐데 평소엔 그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도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새삼 깨닫게 된다. 평소엔 바쁘고 멀리 있다는 핑계로 찾지 않다가도 명절이면 마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는 장관 후보자처럼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 한다. 시댁에 가는 길은 전근대의 시간 속으로 순간 이동하는 타임리프다. 현대와 전근대의 시간여행에서 오는 시차를 매년 겪지만 익숙해지지 않고, 오히려 후유증만 점점 심해지는 중이다.
증상은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1996년 9월 25일에 ‘추석 앞두고 ‘며느리 증후군’ 확산’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20~30대 주부들이 갑자기 팔다리가 아프거나 힘이 없는 등 스트레스성 신경질환의 일종인 ‘며느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추석이 여자를 위해, 적어도 20년째 ‘며느리 증후군’에 시달리는 여자를 위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장을 보고,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항상 온화한 표정과 고운 말씨를 유지하고, 생선을 굽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음식을 차리고,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과일과 차를 내고, 상을 물리고 다시 술상을 보고, 술상을 치우고, 여전히 온화한 표정과 고운 말씨를 유지한 채 다시 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 여자를 위해 추석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추석은 남자를 위해 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추석 기간 내내 여자가 차려주는 밥과 과일과 술을 받아먹고 아무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속 편하게 지내다 돌아오는 남자를 위해 추석이 오는 것은 아닐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남자 역시 추석이 가까워지면 이유도 없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해진다. 남자에게 추석은 풍성하게 돈 나갈 일이 많은 시기다. 본가와 처가의 선물도 사야 하고 부모님 용돈도 추석 특집으로 챙겨 드려야 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귀여운 조카들에게도 용돈을 줘야 하고.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혼한 남자는 누군가의 남편이다. 물론 ‘누군가’는 극심한 명절증후군에 시달리는 여자다. 남편이 타인의 고통에 전혀 둔감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사이코패스라면 모를까, 함께 사는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마음 편하고 즐거울 남자가 어디 있겠는가? 명절은 짧고 후유증은 길다. 남편이 속없는 사람처럼 허허 웃고 있어도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드러내는 야당 의원 앞에 선 장관 후보자 처지인 셈이다. 그러니까 추석이 남자를 위해, 적어도 온화한 표정 아래 점점 굳어가는 아내의 안면 근육이 자꾸 신경 쓰이는 남자를 위해 오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 추석은 아이들을 위해 오는 건 아닐까? 오랜만에 아버지 고향에도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뵙고, 사촌들도 만나니까 마냥 즐거울 것 아닌가. 여기저기서 용돈도 두둑하게 받을 테고. 학교에도 안 가고. 그래 봐야 며칠이겠지만 잠시나마 공부하라는 잔소리도 안 들을 거고. 사촌들과 PC방에 놀러 간다 해도 나무라지 않을 테니까. 역시 추석은 아이들을 위해 오는 것일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아이들은 이제 비대면 접촉에 익숙하다. 대면 접촉은 어색하고 불편하다. 가족도 그럴진대 하물며 모처럼 만나는 친척은 어쩐지 피곤하고 힘들다. 싫은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다. 친구들이 더 좋고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 훨씬 편하다. 그것은 어리거나 좀 더 나이 든 아이들이나 마찬가지다. 대화의 공통점도 없는, 잘 모르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일은 스트레스다. 아이들에겐 명절에 보이는 어른들의 모습이 일종의 부조리한 소동극 같다. 일 년에 한두 번 만나서 매번 정해진 질문과 대답을 똑같이 주고받는 대화라니.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다. 음식만 해도 그렇다. 누구 입맛에 맞춘 것인지 모르겠지만 평소 잘 먹지 않는 음식으로만 채워져 있는데 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된다. 그러니까 추석이 아이들을 위해 오는 것도 아니리라.
그렇다면 추석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노인을 위한 것이 아닐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지만 노인을 위한 명절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모처럼 자식들과 손주들을 보니까 기쁠 것이다. 사랑은 원래 내리사랑이라지 않던가.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진다. 개인주의니 뭐니 하지만 사람이란 역시 이렇게 서로 얼굴도 보고 함께 어울려 지내야 사람다운 법이다. 비로소 사람 사는 느낌이 든다. 명절에 모두 모였을 때 살아온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으니 그 또한 흐뭇하다. 그러니 추석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오는 건 아닐까?
꼭 그렇지도 않다. 명절에 찾아올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다 해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모이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다. 외로운 사람은 명절에 더 외로운 법. 외롭기는 명절에 가족이 찾아와도 마찬가지다. 며느리는 억지로 웃고, 아들은 제 안사람 눈치를 살피느라 전전긍긍하고, 손주들 역시 잠깐 인사만 할 뿐 PC방으로 달아날 궁리만 한다. 그래도 가장 힘든 것은 세상 인심이다. 언론만 봐도 노인은 숫제 가해자 신세다. 며느리를 소환해서 억지로 일시키고 감정노동을 하게 만들고 가부장적 질서를 강요하고 명절증후군을 앓게 만드는 무지막지한 가해자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추석이 노인을 위해 오는 것도 아니리라.
사정이 이런데 대체 추석은 누구를 위해 오는 것일까? 알 수 없다. 누구를 위해 오는지 모르겠지만 추석은 해마다 오고 우리는 매번 부모님 계시는 고향을 찾는다. 아무리 길이 막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도 말이다. 저마다 형편에 맞게 차려입고 선물 꾸러미 들고 고향을 찾아 부모님, 일가친척과 함께 추석을 보낸다. 저마다 한껏 웃으며 말이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의 거짓말인지도 모른다. 결혼하기 싫다는 아이가 자라서 친구들보다 먼저 결혼하고, 장사하는 분이 밑지고 판다면서도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애쓰는 것 같은 거짓말. 명절 같은 건 사라져야 한다며 명절증후군에 대해 격렬하게 떠들지만 어느새 고향으로 내려가는 차에 먼저 가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짓말.
가끔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다. 아주 먼 옛날에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있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야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셔야 하고, 어머니의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많아지다 보면 금세 지구는 나의 조상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해지고 만다. 그러니까 지금 나 하나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인가.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미국 서부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판다는 목각 새처럼 나도 뒤로 날고 싶어진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생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으니까.
투덜대면서도 추석이 오면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것 역시 그런 것 아닐까? 미래니 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면서 평소에는 경쟁하며 앞으로만 달려가다가 추석 같은 명절이 오면 1년에 한 번쯤 뒤로 날아보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런 확인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서로에게 진한 감정이입으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시간인 것은 아닐까. 서로의 수고를 헤아리고 서로의 서운함과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번 추석은 서로를 좀 더 다정하게, 좀 더 귀하게 대하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오면 좋겠다.
김상득 | 칼럼니스트·듀오 이사